메인 메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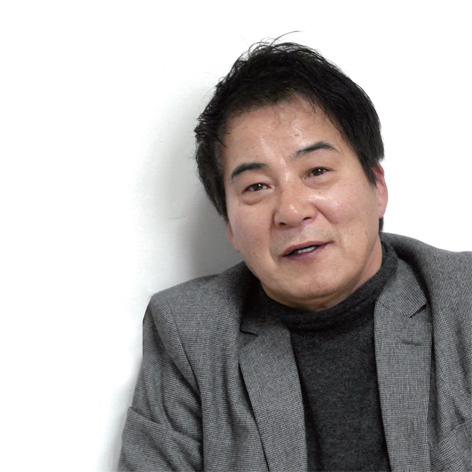
중국 길림성 용정시-명동촌 중간 지점인 ‘동량리 어구’는 1920년 1월 4일 무장독립조직 철혈광복단원 6명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만주철도 부설자금 운송차량을 습격하여, 거금 15만 원을 탈취했던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개봉되어 불황에 허덕이던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액션영화 <놈, 놈, 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2010년 8월 현장을 찾았을 때 가이드는 ‘15만원 탈취사건’ 기념비를 가리키며 “거금 탈취 기념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허탈해했다. 순간 왕년의 도루왕 김일권 선수가 생각났다. 그가 프로야구 최초로 300도루를 달성하고 동료들에게 했다는 농담 중 “대한민국에서 도둑질 잘했다고 상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는 대목이 떠올라서였다. -기자 말-

프로야구 원년(1982) 도루왕 김일권. 그는 해태 타이거즈(82~87), 태평양 돌핀스(88~90), LG 트윈스(91) 등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1982년 7월 18일 광주구장(해태-OB)에서 한경기 개인최다 도루(5개) 기록을 작성한다. 사흘 후(21일)에는 인천구장(해태-삼미)에서 프로야구 최초 ‘단독 홈스틸’에 성공한다. 프로통산 5회(82, 83, 84, 89, 90) 도루왕을 차지했다. 1989년 9월 7일 인천구장(태평양-해태)에서 사상 처음 300도루를 달성하고, 그해 골든글러브상을 받았다. 프로야구 10시즌 동안 842경기에 출장(0.253), 363개 도루의 금자탑을 쌓았다.

아마추어 시절 국제대회에서 작성한 한 대회 최다 도루 기록도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980년 8월 22일~9월 5일까지 일본 도쿄 고라쿠엔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6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도루(18개), 득점(18득점) 두 부문 개인상의 영광을 차지한 것. 그때까지 최다 도루 기록은 11회 때 파나마의 밀러와 20회 때 일본의 오바(大場勝)가 세운 14개였다. 타격 부문에서도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높은 4할 7푼 6리(전체 3위에 링크)의 놀라운 타율로 주최국 일본과 공동 준우승(9승 2패)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고향 팬들은 지금도 ‘도루왕’으로 기억
1992년 현역에서 은퇴하고 쌍방울 레이더스 주루코치(93~95), 해태 타이거즈 주루코치(96~97), 현대 유니콘스 주루코치(1998), 삼성 라이온즈 주루코치(02~04), 야구 해설위원 등을 거쳐 얼마 전 경영인으로 변신한 대도 김일권. 판촉물 제조업체 (주)아이케이 코스모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를 군산 미즈커피에서 만났다.
그가 그라운드를 누비던 80년대는 프로야구 초창기로 한 시즌 경기 횟수가 요즘보다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프로통산 도루 기록(10시즌 363개)은 2014년 3월 현재 전체 6위를 마크한다. 놀라운 것은 7위 김주찬(12시즌 329개), 8위 유지현(11시즌 296개), 9위 김재박(11시즌 284개)보다 훨씬 앞서고, 5위 이순철(14시즌 371개)과 8개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프로통산 도루왕 5회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타준족’의 대명사로 틈만 보이면 뛰었던 선수. 사람들은 그를 ‘대도’(大盜)라 부른다. 프로 원년 ‘도루왕’이라며 ‘원조 대도’라 부르기도 한다. 대도는 ‘큰 도둑’이라는 뜻. 1루에서 2루, 3루를 훔치고 홈스틸 하는 모습이 도깨비처럼 날쌔다고 해서 ‘괴도’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달인의 경지’에 오른 그의 주루 플레이는 관중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선수 유니폼을 벗은 지 어언 23년. 지금도 고향(전북 군산) 팬들은 그를 말할 때마다 ‘도루왕’을 앞세운다.
“야구선수 김일권이말여? 왕년에 ‘도루왕’였잖여. 해태타이거즈 선수였을 때는 해마다 도루왕을 차지혔던 것으로 기억허는디... 하이간 군산상고 선수 때부터 키는 작어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운동장을 지맘대로 날러댕기는(날아다니는) 갱까도리(날쌘돌이) 선수였지.”
“안타든 볼 넷(4구)이든 1루에만 나가믄 2루는 따(떼어) 놓은 당상이었지. 야구장을 내 집 마당처럼 휘젓고 댕겼응게. 그려서 나는 군산상고나 해태가 지고 있을 때도 김일권이 안타를 치고 나가믄 마음이 놓였어. 무사(無死) 때 주자로 나가믄 최소한 1점은 올렸응게.”
“호랭이(해태) 유니폼 입고 금방 도루허는 것처럼 모숑(모션)을 쓰면서 상대 팀 투수와 포수를 놀리는 모습은 희열이라고 할까. 또 다른 재미를 느꼈지. 속이 상하다가도 김일권이 도루를 성공허는 순간은 유쾌, 상쾌 통쾌혔응게.(웃음) 내가 결혼허기 전부터 좋아혔던 선수였는디 요새는 뭐 허고 사는지 모르겠네. TV에도 안 나오고···.”
계란 노른자가 동동 떠다니는 달콤한 모닝커피 향과 예쁜 꽃무늬 커피잔이 조화를 이루는 군산의 옛날식 다방에서 만난 60~70대 야구팬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김일권에 대한 기억들이다.
배트와 볼을 손에 쥐면 기가 솟고 몸동작도 빨라져
김일권(59)은 전북 군산시 둔율동(골목동네)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직업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 겨우 가난은 면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성격은 내성적, 수줍음도 잘 탔다. 뒷집 심술쟁이 아이가 꼬집고 때려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턱 아래 흉 자국도 그때 흔적이란다. 그럼에도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운동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야트막한 노서산(老鼠山) 줄기를 중심으로 조성된 둔율동은 조선 시대에 둔전(屯田)이 있던 마을이라 해서 ‘둔배미’, ‘군청고개’ 등으로 불리었다. 지명에서 나타나듯 50~60년대만 해도‘도시 속 산골’로 여름이면 뒷산의 아름드리 고목들이 하늘을 가렸고, 겨울에는 천연 눈썰매장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고갯마루의 둔율성당과 간장공장 앞마당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산실 노릇을 해주었다.
“저는 1962년 남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때는 누가 짓궂게 굴어도 대들기는커녕 말도 못하는 순둥이였죠. 그래도 볼(ball)과 배트를 손에 쥐면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기가 솟고 동작이 빨라졌습니다. 군산 남초등학교 4학년 때 특별활동을 통해 야구를 시작해서 투수와 3루수를 겸했는데, 그때부터 영호남 대회 2연패를 하는 등 운동장을 누볐죠. 뒷산(모시산)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고된 훈련도 투구와 타격연습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으니까요.”
남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함께 시작한 송상복(스마일피처)은 “처음에는 (김)일권이가 투수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야구 감각도 뛰어나고, 순발력도 좋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등 좀 특출한 친구였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동료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는 등 희생정신도 강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말은 없지만,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친구여서 가끔 손해를 볼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초등학교 야구부는 군산시내 네 개 초등학교 중 가장 강팀으로 성장한다. 김일권, 송상복, 양종수, 조양연, 김기철 등 남초교 선수 11명의 평소 연습을 눈여겨본 당시 전북 야구협회 이용일 회장과 군산 남중·상고 김병문 교장은 그들을 모두 1968년 창단한 군산 남중에 특기생으로 입학시킨다. 그중 김일권, 송상복, 양종수, 조양연 등은 3년 후 나란히 군산상고에 입학한다.
“1971년 군산상고(야구부 4기)에 진학해서 선배(3학년)들 ‘줄빠따’(매타작)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1.2학년생들이 중국집에 모여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도망가자고 모의를 했겠어요. 저는 서울로 튀었다가 사흘 만에 잡혀와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았죠. (웃음) 스무 대 맞으니까 얼얼하더군요. 그렇게 매타작을 당하면서 ‘반항심’이랄까, 모순점이 보이면 따지기도 하는 등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연습은 죽어라 했죠.”

군산상고 3학년 때 ‘이영민 타격상’ 받아
고된 연습과 선배들의 매타작을 투지와 뚝심으로 버텨낸 김일권은 2학년 때부터 1번 타자 자리를 굳힌다. 야구 전문가들에게 군산상고 간판타자로 인정도 받는다. 그에 화답하듯 시합 때마다 포문을 열면서 득점과 연결되는 장단타를 터뜨렸다. 4구를 골라 1루에 진루할 때는 천부적인 주루 감각과 빠른 발로 상대 팀 마운드를 혼란에 빠뜨렸다.
전국고교야구 기존 판도를 뒤엎었던 1972년 황금사자기 대회 부산고와 결승전 9회 말 기적같이 일궈낸 역전 우승에도 기여하면서 고교야구 스타로 떠오른다. 그해 가을 일본 관서(關西) 지방에서 열린 한·일고교야구대항전(11월 11일~21일)에 한국고교 선발팀 일원으로 원정, 제3차전 나라(奈良)팀과 경기에서 도루 5개를 기록하는 등 호타준족의 기량을 마음껏 과시한다.
1973년 군산상고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4강에 한 번도 들지 못한다. 그해 5월 대통령배 대회에서 인천고와 11회 연장 끝에 4-5로 석패한 것을 비롯해 청룡기대회는 경남고에 1-3으로, 봉황기 대회는 전남고에 0-1로, 황금사자기 대회는 8강전에서 대전고에 4-5로 패하는 등 잇달아 고배를 마신다. 그러한 부진 속에서도 김일권은 한국고교야구 대표팀에 선발 되는 등 신기에 가까운 타력을 보여준다.
그는 1973년 12월 ‘이영민 타격상’을 받는다. 스승 최관수 감독이 동산고 시절 받았던 상이어서 의미를 더 했다. 1958년 제정된 이영민 타격상은 대한야구협회가 매년 3회 이상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30타석 이상 기록한 고교선수 가운데 타율이 가장 높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김일권은 그해 4개 대회에 출전, 41타수 17안타(타율 4할 1푼 5리)를 기록했다. 그는 상과 함께 팬레터도 많이 받았었다며 1998년에 타계한 스승을 떠올렸다.
“최관수 감독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죠. 고급 전술과 타법을 터득한 것은 물론이고요. 지리멸렬했던 팀을 국내 정상 수준으로 올려놓은 지도력,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등이 놀라웠죠. 특히 ‘한문과 주산은 꼭 배워두라!’는 당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배운 실력이 지금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가끔 옛 모습이 떠오르면서 건강하셨으면 해태 타이거즈 초대 감독을 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프로야구가 없던 1973년. 그해 국내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반 야구선수는 모두 235명(고교 216명, 대학19명)이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학과 실업팀 스카우트 대상에 오른 선수는 고작 50명 안팎이었다. 따라서 170명 정도는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하면 선수생활을 그만두어야 했다. 한편 김일권은 고려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놓고 있었다. (계속)
- 바로크미술 대표화가 - 2.안0000.00.00
- 어제를 반성해 오늘을 만든다,0000.00.00
- ‘하늘로 쏘아 올린 우주의 꿈2026.03.03
- 군산시민예술단 박문원 단장의 2026.03.03
- '단심(丹心)으로 사회복지 앞2026.03.03
- “스포츠 마케팅으로 불황을 극2026.03.03
- “커피엔 정답은 없지만, 오답2026.03.03
- 손으로 짓는 삶, 한복 디자이2026.03.03
- 원어민 강사진 / 조연옥 중국2026.03.03
- 논이 풍경이 되다-농부가 만든2026.03.03
- 이영미의 도시칼럼-데이터로 보2026.02.26





